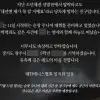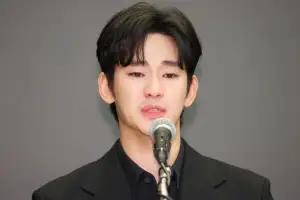2000년 이후 퇴임 32명 중 19명이 로펌행·개인사무실 개업
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“대법관에 봉직하면 퇴임 후 사건 수임을 위한 개업을 하지 않겠다”고 밝히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‘도장 값’ 문화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끈다.박 후보자의 발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는 등 재야 법조계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활동을 막아야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.
그러나 그의 이런 발언이 자신은 물론 앞으로 고위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..
전관예우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법관 퇴임 후 곧장 로펌행이나 개업을 택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지만 1∼2년이 지나고 나서는 결국 ‘변호사’ 업계로 들어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다.
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을 기준으로 보면 김능환 전 대법관과 고현철 전 대법관 등 19명이 대형 로펌에 고문이나 변호사로 영입됐고, 강신욱 전 대법관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 4명은 개인 사무실을 개업했다.
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대법관 4년차 때 감사원장을 거쳐 총리로 임명되면서 공직으로 나갔다.
변호사가 아닌 교수나 공익법인 등을 택해 스스로 ‘도장 값’을 포기한 대법관은 전수안 전 대법관과 조무제 전 대법관, 김영란 전 대법관 등 8명뿐이다.
특히 퇴임 후 개업을 하지 않고 편의점을 운영하며 화제를 모았던 김능환 전 대법관도 6개월 만에 “’무항산(無恒産)이면 무항심(無恒心), 즉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”며 법무법인 율촌 행을 택했다.
대법관 퇴임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직을 맡았던 이강국 전 헌재소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때는 “퇴임후 법률구조공단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”고 밝혔지만 약 2년 뒤 중견로펌행을 택했다.
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법관을 지냈다고 해서 변호사 활동을 아예 막을 수 있느냐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.
앞서 2014년 2월 조희대 대법관도 청문회에서 퇴임 후 진로와 관련해 “지금으로서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”이라고 밝혔고, 권순일 대법관도 2014년 8월 퇴임 후 “곧바로 대형로펌에 간다든가 해서 사익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”고 말한 바 있다.
박 후보자 역시 이날 청문회에서 “엄중히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”는 말로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지만, 앞서 대한변협이 제시한 개업포기 서약서에 서명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다.
연합뉴스
Copyright ⓒ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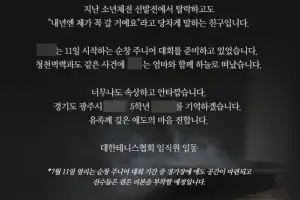

![thumbnail - “이게 왜 여기서 나와?” 경악…펄펄 끓는 동해서 무슨 일이 [포착]](https://img.seoul.co.kr/img/upload/2025/07/10/SSC_20250710135853_N2.png.webp)